스포츠
[장원재의 논어와 스포츠] 축구 역사논쟁 - 이란의 무례
기사입력 2013.06.18 09:43 / 기사수정 2013.06.18 11:35
김덕중 기자

[엑스포츠뉴스=장원재 칼럼니스트] 이란 언론이 자꾸 도발한다. 말끝마다 6-2 얘기다. 자기들은 예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한국 언론과 선수단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단다. 이란 원정 경기 때 동네 공원 수준의 연습장을 제공하고, 예약된 호텔에 방이 다 찼다며 시간을 끌고, 버스 기사가 길을 모른다며 우리 선수단 전원을 두 어 시간 길바닥으로 끌고 다니며 ‘컨디션 교란하기 대작전’을 펼친 것이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소생, 기꺼이 ‘역사논쟁’에 참여하기로 한다.
1977년 11월 11일 테헤란 아리야메르 경기장.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 대 한국 전. 5개국이 홈 앤드 어웨이로 격돌한 최종 라운드 당시의 선두는 3승1무의 이란, 2위는 2승3무1패의 한국이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의 별칭은 화랑(花郞). 주장 김호곤을 필두로 차범근, 허정무, 김재한, 김진국, 박성화, 조영증, 박상인, 조광래 등이 포진한 호화멤버였다.
전반전, 그들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앞서 나가자 이란 팀은 필살기를 들고 나왔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무려 11분. 방송중계팀이 우주중계 예약시간을 걱정할 정도였다. 이렇다할 충돌도, 부상자도 없던 경기였다. 부심이 추가시간을 바깥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던 시절이다. (이 제도는 98년 월드컵부터 도입되었다.) 불 것은 불지 않고 안 불 것은 부는 주심의 운영 덕에 후반 종료시간 당시의 스코어는 2-1 이란 리드. 여기서 이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주심의 ‘양심’이다. 전반전의 ‘11분 추가시간 배당’이 본인 생각에도 너무했다 싶었던지, 이 심판, 후반전 추가 시간도 4분을 배정했다. 1-2분만 주어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이란이 이길 테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종료 직전에 터진 한국의 극적인 동점골! 차범근의 돌파에 이은 땅볼 크로스가 문전으로 흘렀고, 이란 수비 두 명은 ‘볼이 아니라 사람을 찬다’식 육탄 저지를 시도했다. 양 쪽에서 들이받는 이란 수비수 사이로 한국 선수 하나가 낑겨들었고, 오른발로 공의 진행방향을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로 골을 완성했다. 당대 아시아 최고라는 이란 골키퍼 헤자지는 동작 타이밍을 뺏긴 채 그대로 서서 골을 허용했다. 이란 국영 TV가 골문 뒤에서 잡은 화면을 재구성해보자. 아래위 흰색 경기복을 입은 이란 수비수 둘이 꽉 잠긴 성문(城門)처럼 몸을 밀착시켰고 우리 공격수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단지, 두 사람의 몸 사이로 비죽이 내밀어진, 붉은색 스타킹을 착용한 오른발 하나. 골이 아니었더라도, 공격수의 전진을 이런 식으로 저지하는 건 명백한 페널티킥 감이다. 물론,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을 내린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지만. 최종 스코어는 2-2. 이날 경기에서 두 골을 모두 넣으며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은 백넘버 9번, 끈기와 지구력의 상징이던 이영무(李榮武), 현 K리그 고양 Hi FC 감독 바로 그 선수다.
최종예선 결과는 6승2무 이란의 월드컵 진출. 월드컵엔 전 세계에서 단 열 여섯 나라만 출전하고, 아시아-오세아니아를 합쳐 단 한 장의 본선진출권만 배당되던 시절이다. 조 2위는 3승4무1패의 한국. 한국의 1패는 호주 시드니 원정경기 1-2 역전패고 이란의 다른 무승부는 부산 구덕경기장, 한국과의 0-0 무승부다.
이란이 당대 아시아 최강이었던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플레이스타일은 세계무대에서 대가를 치렀다, 고 소생은 생각한다. 월드컵 본선 첫 경기 대 네덜란드 전 0-3 패. 스코틀랜드 전 1-1 무승부. 마지막 경기 페루 전은 1-4 대패. 겉모습만 보자면, 1무2패가 아시아 대표의 성적으로는, 그것도 월드컵에 처음 나선 나라의 성적으로는 부끄러운 결과가 아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스코틀랜드의 득점은 이란수비수 에스칸다리안의 자책골이었고, 네덜란드와 페루는 각각 PK 두 개 씩을 얻어 모두 골로 연결했다. 조별리그에서 한 팀이 PK를 네 개나 허용한 건 월드컵 84년 역사상 78년의 이란이 유일하다. ‘과도한 육탄방어’와 ‘심판의 묵인’이라는 아시아식 수비전술은 적어도 월드컵 본선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던 그대로’ 움직였던 이란 수비수들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집에서 새던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는 건 너무 나간 문장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勇而無禮則亂(용이무례즉란).
용맹하기만 하고 예의를 모르면 난폭하게 되거나 혹은 난을 일으킨다.
사족(蛇足) 하나. 열렬한 축구팬이었던 당시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선수단 전원에게 금연을 명했다. 대 페루 전 전반에만 세 골을 내주고 0-3이 되자, 이란 벤치 곳곳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왔다.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던 국왕이 격노, 선수단에게 준다던 벤츠와 호화주택과 그 밖의 보너스가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후문. 담배연기와 더불어, 씁쓸한 패배감과 더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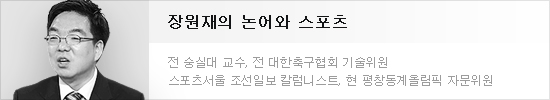
장원재 칼럼니스트 sports@xportsnews.com
[사진=이란 선수들 ⓒ 엑스포츠뉴스DB]
김덕중 기자 djkim@xportsnews.com
- ▶ '이병헌♥' 이민정, 큰아들 공개…기럭지 대박이네
- ▶ 장재인, 또 노브라 패션…하의 실종까지 파격 행보 계속
- ▶ 오또맘, 누드 착시 영상…"이것 좀 봐주세요 다들"
- ▶ '30억 파산' 윤정수 "♥아내에 집 증여 가능…결혼식 비용까지"
- ▶ 박나래♥양세형, 썸 진짜였나?…카메라 몰래 스킨십 '들통'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30억 파산' 윤정수 "♥아내에 집 증여 가능…결혼식 비용까지"
- 2 '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5년만 가요계 복귀…"꿈꿔왔던 순간" (전문)[엑's 이슈]
- 3 박나래♥양세형, 썸 진짜였나?…카메라 몰래 스킨십 '들통'
- 4 '최민환 업소 폭로' 율희, 칼 빼들었다…"인신공격+성희롱, 법으로 혼쭐" (율희의 집)
- 5 민희진, '뉴진스 표절 부인' 빌리프랩 대표 등 고소…50억 손배소 [공식입장]
- 6 이시영, 6세 子 학비만 7억…전지현도 보내는 금수저 '귀족학교' [종합]
- 7 '18세' 임신시킨 교회선생, 7남매 낳더니 이혼 요구… 서장훈 황당 (이혼숙려캠프)[종합]
- 8 '하얼빈' 조우진,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과 재회…강인한 독립군 "아주 큰 각오"
- 9 브루노마스X로제 '아파트' 사녹 원성↑…'2024 마마 어워즈' 싸늘한 마무리 [종합]
- 10 '본능 부부', 6남매+임신 6개월에도 '무직' 충격…"국가지원금으로만 생활" (이혼숙려캠프)[종합]
- 1 마무리훈련 중 '충격 트레이드' 통보→두산 눈물의 급이별…전민재 "내일 다시 이천 와야 할 것 같은데" [이천 현장]
- 2 초대박! 1조5000억, 인간계 몸값 아니다…바르셀로나, 17세 초신성과 6년 재계약 급물살→바이아웃도 대폭 상승
- 3 "손흥민? 누가 이런 선수랑 새 계약하나"…'튀르키예 명문 입단설' SON 나이가 걸림돌? 황당 폭언 나왔다
- 4 "공격수들이 훈련 못 할 정도"…김민재, 콤파니 감독 신뢰 '듬뿍'→1년 만에 평가 '대반전'
- 5 손흥민 초대박! '3000억' 월클 스타 '1월 라이벌전' 터진다…SON 갈라타사라이→호날두 페네르바체 연쇄 이동? '이스탄불 블록버스터' 실현되나
- 6 '김민석과 트레이드' 정철원 "두산 떠나 속상하지만 롯데서 잘하겠다"
- 7 이럴 수가! 손흥민, 토트넘에 실망해 이적 결심…"쏘니, 연장 계약 원치 않는 듯" (英 매체)
- 8 대만, 한국이 무시할 팀 아니었다…미국 8-2 완파→결승 진출 희망 살렸다
- 9 '손흥민 충격 배신' 포스텍, '인종차별' 벤탄쿠르 전격 지지…"구단 항소에 뜻 같이 하겠다"
- 10 '다재다능 이강인, 엔리케 철학에 가장 어울려"…프랑스 매체, '득점 2위' LEE 극찬
- 1 T1, 롤드컵 2연패 이끈 '톰' 임재현 코치와 재계약... 2026년까지 [오피셜]
- 2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디렉터스 프리뷰 시즌편 공개
- 3 엠게임 자체 개발 모바일게임 출격... '귀혼M', 정식 출시
- 4 DX, 58점으로 서바이벌 스테이지 1일 차 1위…DK TOP2 (2024 PMGC) [종합]
- 5 넥슨, 신작 배틀로얄 게임 '슈퍼바이브' 국내 OBT 시작
- 6 엔씨소프트 'TL', 서비스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예고
- 7 'e스포츠도 대박' 10주년 맞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연말까지 축제 이어진다
- 8 '커즈' 문우찬, KT 복귀... '비디디'와 다시 한번 호흡 맞춘다 [오피셜]
- 9 새로워질 핵앤슬래시 명작... '패스 오브 엑자일2', 방대한 콘텐츠+확장된 세계관 '눈길' [엑's 이슈]
- 10 DK, 101점으로 서바이벌 스테이지 2일 차 1위 등극 (2024 PMGC) [종합]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장재인, 또 노브라 패션 공개…연일 파격 행보
- 2 김종국, ♥빅토리아 여친설 진짜였나? "결혼하면 손잡고 좋을 텐데"
- 3 이동국 아들 시안, 생일파티서 돈다발 '줄줄'…화려한 현장 공개
- 4 '김새롬 이혼' 이찬오, 알고 보니 '재혼 6년 차'…아내는 유명 기업 임직원
- 5 아내·두 아들 살인한 父, 죽는 순간 아들 휴대폰에 담겨 '충격'
- 6 태진아, '치매 투병' ♥옥경이 최근 상태 전했다 "진행 멈춰…"
- 7 '박수홍♥' 김다예, 출산 회복 중 응급실行…"장기 내려앉는 느낌"
- 8 이상민, ♥솔비와 핑크빛 언제부터였나 "호감 이어지면 만남 돼"
- 9 '마약 자수' 김나정 충격 "묶인 체 강제 흡입 당했다…증거 영상 有"
- 10 '이병헌♥' 이민정, 큰아들 공개…기럭지 대박이네
- 1 '대만 진출' 이다혜, 격한 춤에 허벅지 초커 훌러덩…화끈하네
- 2 'E컵 치어리더' 김현영, 유니폼 버거운 볼륨 자태…팬들 난리
- 3 굿바이 토트넘! 손흥민 떠나 맨유 간다...옛 스승과 재회 가능성 급물살
- 4 KBL 최초 신인드래프트 1 ·2순위 모두 고교생…정관장,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5 '핵펀치' 대신 '핵따귀'만 남았다…'58세' 타이슨 19년 만의 복귀전, 27세 복서에게 '판정패'
- 6 '이럴수가' 손흥민 1월부터 새 구단 협상…'막아라' 토트넘 발등에 불 떨어졌다
- 7 대한핸드볼협회,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핸드볼대회 성료
- 8 'K-스포츠산업을 세계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도네시아 박람회 참가
- 9 핸드볼 두산 '영원한 GK' 박찬영, 은퇴식서 눈물…"행복하고 즐거웠다"
- 10 한국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 金 7개 1위…임종언 4관왕 달성
- 1 T1 제우스-HLE 도란, 소속팀과 계약 종료 "다음 여정 응원"
- 2 넥슨표 AAA게임, 부산 달궜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 호쾌한 액션 '눈길' [지스타 2024]
- 3 하이브IM AAA급 MMORPG 도전작 '아키텍트', '전투+모험' 재미로 韓 유저 사로잡았다 [지스타 2024]
- 4 원작 매력 제대로 살렸다... '몬길: 스타 다이브', 韓 유저 공략 '준비 완료' [지스타 2024]
- 5 그라비티, '라그나로크M'X'요리왕 비룡' 전격 컬래버…다양한 이벤트 진행
- 6 '세나' 뜨니 넷마블 부스 '들썩'... 진정성 있는 운영 강조한 '세나 리버스' 개발진 [지스타 2024]
- 7 '모건' 박루한, OK저축은행 브리온과 재계약 "내년엔 더 좋은 성적 낼 것"
- 8 INF, 123점으로 그룹 그린 2일 차 1위 등극…DK TOP3 (2024 PMGC) [종합]
- 9 '최선있티' 구마유시, T1과 재계약 발표 "2025년에도 함께한다"
- 10 '퍼스트 디센던트', 유저 피드백 반영한 시즌2 업데이트 예고... 반등 신호탄 쏘나 [엑's 이슈]
화보







![지드래곤, ♥정형돈 '10년 짝사랑' 결실 맺었다…재결합 가능성 '솔솔'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2/thm_1732286613541932.jpg)
!['활동 중단' 문가비, 극비리 출산했다 "갑작스러운 임신, 준비 안 됐지만…"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2/thm_1732275893282250.jpg)
!['득녀' 송중기, 미담 터졌다…'빈센조' 보조출연자 구한 사연 재조명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2/thm_1732270395056434.jpg)
!["둘 케미 뭐야?" 공유♥서현진 설렘→확 달라진 연기법+2년 공백 깬다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2/thm_1732261709280405.jpg)
!['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5년만 가요계 복귀…"꿈꿔왔던 순간" (전문)[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2/thm_17322589517655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