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지막 두 달 정말 행복했다, 17승 때보다 더" [엑:스토리]
기사입력 2022.01.07 20:00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영하(24, 두산 베어스)는 지난해 9월 13일 잠실 LG와 더블헤더에서 구원승으로만 2승을 거뒀다. 하루에 2승을 거둔 건 역대 6번밖에 나오지 않는 진기록이다. 김태형 감독은 순위 싸움이 한창이던 당시 이영하의 활약이 7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봤다.
이영하는 그날부터 구원 등판한 21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4 이닝당출루허용률(WHIP) 1.06으로 맹활약했다. 이때 던진 425구는 같은 기간 두산 불펜 가운데 가장 많은 투구 수다. 이영하는 "나는 힘들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 이름을 불러 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속된 말로 내가 싸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치우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었다.
지난해에도 선발로 시작했던 이영하는 또 한 차례 시즌 도중 보직을 바꿨다. 선발로도 반등 가능성을 보여 준 시기가 있었지만 고비마다 주위의 도움이 모자라기도 했다. 당시 김 감독은 "딱 한 번만 고비를 넘으면 될 것 같다"고 했었다.
최근 엑스포츠뉴스와 연락이 닿은 이영하는 "주위에서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셔도 내가 '이정도로 안 되는데'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한 경기씩 잘한 날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불펜으로 타이트한 상황에 1이닝씩 던진 게 도움이 됐다"며 "마운드에서 고집해 온 것들도 조금씩 내려 놓으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이영하는 2군에서도 공 두 박스를 던지며 투구 밸런스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었다"던 노력은 효과를 봤다. 이영하는 "재작년 중반부터 안 좋아지면서 1년 반 정도 고생했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우울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야구인데, 그 야구로 잘 안 풀리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도 컸고 걱정도 많았다. 그런데 하루에 2승했던 그날부터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2군에서도 코치님들께서 '잘할 필요 없다. 너무 잘하려고 부담 갖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힘이 됐다. 그때부터 즐기려 했다. 마인드 컨트롤도 수월해지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이영하는 포스트시즌에서도 중심에 서 있었다. 홍건희와 함께 마운드를 지탱했다. 당시 김 감독은 "영하와 건희가 무너지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하는 "형들도 '너 안 힘드냐. 어디 아프거나 너무 힘들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걱정해 줬다. 그런데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내 몸보다 팀을 더 생각하게 된다. 그때 감독님 인터뷰도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 불펜에는 나와 건희 형만 있지 않았다.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정규시즌 막판부터 포스트시즌까지 두 달 가량을 돌아봤다. 그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전에는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힘들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절실했다. 마지막 두 달 동안 정말 행복했다. 17승했을 때보다 더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영하는 또 "이제는 (선발이든 불펜이든) 시키는 거라면 뭐든 한다는 마인드다. 지난해 '하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해 봤는데 많이 힘들었다. 나보다는 감독님의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 내게 맞는 자리를 찾아서 시켜 주시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 ▶ '맥심 완판녀' 김이서, 농구장에 떴다…건강미 넘치는 댄스
- ▶ '군면제 논란' 박서진, 극단적 선택 시도…안타까운 가정사까지
- ▶ '72억 건물주' 손연재, 대저택서 아들 품에 안고 눈 구경
- ▶ 허경환, '27억 사기' 피해자였다…"파산 후 고향 내려갈 위기"
- ▶ '맥심 선정 섹시女 1위' 노브라 골퍼, 육감적 몸매로 골프 레슨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단독] 배우 박민재, 中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사망 "너무도 황망하게"
- 2 민희진 측 "뉴진스 탈출→탬퍼링? 일방적 주장…법적 책임지길" (공식입장)[전문]
- 3 [단독] 배우 박민재 사망, 중국 여행 중 심정지 "너무 황망하고 어이없어" (종합)
- 4 "거짓 기사로 명예훼손" 민희진 VS "뉴진스 탈하이브 계획" 탬퍼링 의혹 [엑's 이슈]
- 5 '달라진 분위기' 신수지, 군살 제로 몸매는 여전해
- 6 '이한신' 고수, 목숨 위협한 송영창에 경고 "곧 보답하겠다"
- 7 '이한신' 고수, 박노식 죽음 진실 밝히려 도박 사건 접근
- 8 '자기관리 끝판왕' 김성령-이일화, 20대도 울고 갈 도자기 피부
- 9 '이한신' 고수, 박노식 누명 벗기려 타짜 변신해 하우스 입장 [종합]
- 10 박나래, 두 달 늦게 접한 비보 "소중한 동생, 하늘나라로 떠나" [전문]
- 1 "손흥민 NO" 바르셀로나 0% 꿈 '와르르'…감독도 반대 명확 "나이 너무 많아"
- 2 '충격' 손흥민(33·바르셀로나), 산산조각 났다…"SON 늙었어, 바르셀로나 미래만 생각"
- 3 빙속 김준호,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500m '동메달'…시즌 첫 메달 수확
- 4 "첫 만남 계약 조건 교환 없었어"…임기영·서건창 FA 장기전 예고? KIA 신중하게 접근한다
- 5 김승겸,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빙속 주니어 대표팀, 1차 월드컵서 금1·은4
- 6 임동규·김광국, 이세호 해설 '쎄이호TV' 출연 확정…SOOP에서 배구팬들 만난다
- 7 손흥민 바르셀로나 입단? 이젠 완전 끝…"BARCA 관심 접었다, 손흥민 나이 많아"
- 8 "더 떨어질 곳 없으니까"…'베테랑 잠수함' 박종훈, 반등을 다짐하다 [인터뷰]
- 9 '큰일났다' 이강인 소속팀 충격 대분열…"PSG 선수단, 엔리케 감독에 불만"
- 10 2024 KBO 코치 아카데미 개강…"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높일 예정"
- 1 시프트업 '니케', 'AGF 2024' 출격... 연말 축제 분위기 물씬 풍긴다
- 2 넷이즈게임즈 기대작 '원스 휴먼 모바일', CBT 돌입
- 3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푸른 달빛 속에서' 얼리 액세스 출시
- 4 하이브IM '별이되어라2', 신규 캐릭터 '아슬란' 업데이트
- 5 나이언틱, '포켓몬 고 투어: 하나지방' 내년 2월 미국 LA-대만 신베이시 개최 결정
- 6 20년 간 서비스 했더니, 헉 소리 나는 기록! 특별한 시상식으로 빛난 '마비노기 블록버STAR' [엑's 현장]
- 7 20주년 '마비노기', 연말 기획도 풍성... '블록버STAR'서 신규 콘텐츠+이터니티 추가 정보 공개 [엑's 이슈]
- 8 KT-피어엑스-브리온, A조서 2승 출발... 광동 3패 '최하위' [KeSPA컵]
- 9 젠지, 3승 0패로 '2024 LoL KeSPA CUP' 그룹 B조 선두 등극
- 10 'DRX-젠지 출격!'…SOOP, 10일 '발로란트' 대회 'SVL 2024' 개막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신지 "만삭만 아니면 무대 가능"…'♥결혼' 김종민 이어 줄줄이 경사? (신랑수업)[종합]
- 2 주병진 사기당했나…맞선녀 김규리 정체 논란
- 3 에릭♥나혜미 아들, 벌써 이렇게 컸나…화목한 나들이 사진 공개
- 4 이장우, '나혼산' 포기·♥조혜원 택했나..."결혼→2세는 많이" [엑's 이슈]
- 5 백지영 "둘째 임신은 아들이길"…♥정석원과 이혼 가능성 0%
- 6 최지우 딸, 이렇게 예쁘게 컸다니…엄마 쏙 빼닮은 미모 '감탄'
- 7 고현정, 두 자녀 사진 올린 이유? 정용진과 이혼 근황 최초 고백
- 8 '정우성 子 출산' 문가비, CG같은 글래머 몸매 재조명
- 9 '72억 건물주' 손연재, 대저택서 아들 품에 안고 눈 구경
- 10 정우성 탈탈 털리는 중, 입 열려나?…스킨십 사진 유출→양육비 300만원 '관심 집중' [종합]
- 1 '맥심 선정 섹시女 1위' 노브라 골퍼, 육감적 몸매로 골프 레슨까지
- 2 치어리더 이다혜, 하의 생략 파격룩…볼륨감도 대단
- 3 'E컵 치어리더' 김현영, 가슴 다 못 가린 의상…파격 노출 감행
- 4 유현조 '인생의 한 번 뿐인 순간'[포토]
- 5 2024년 필드를 빛낸 선수들[포토]
- 6 KLPGA '최고의 별' 윤이나, 징계복귀→'대상 포함 3관왕' 영예…"미국 도전도 자신 있어"
- 7 윤이나-유현조 '대상과 신인왕의 하트'[포토]
- 8 윤이나 '2024년은 나의 해'[포토]
- 9 '선수 폭행' 논란 김승기 前 소노 감독, 중징계 철퇴…KBL 2년 자격 정지→구단엔 엄중경고 [공식발표]
- 10 [오피셜] 김민재 얼굴 스테이플러로 봉합…케인+KIM 동반 부상→뮌헨 초비상
- 1 컴투스홀딩스 '가이더스 제로', 스팀 얼리 액세스 돌입
- 2 '발로란트' e스포츠, 2025년 1월 본격 개막... 지역별 신규 팀 합류 '눈길' [엑's 이슈]
- 3 DRX 씨재-DK 파비안 "목표는 우승…가능성 충분해" (2024 PMGC) [인터뷰]
- 4 농심, '어센션 챔피언' SPG와 힘 합쳤다... 2025 VCT 퍼시픽 합류
- 5 '크로스파이어' 최강자전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12월 4일 中 항저우서 개막
- 6 2025년 젠지 로스터 '기-캐-쵸-룰-듀', 완전체 첫 출격... 다시 한번 대권 도전 나선다
- 7 인상깊은 인디게임 보고 싶다면 여기로! '버닝비버 2024', 83개 작품과 함께 본격 개막
- 8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버닝비버 2024'서 창작자-유저 간 소통의 장 마련
- 9 액션슬래시 신작 '패스 오브 엑자일2', 12월 7일 출격... '콘텐츠+편의성' 모두 잡았다 [엑's 현장]
- 10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 발표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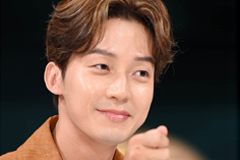





!['박소현♥' 치과의사, 알고 보니 과거 장윤정과 맞선 실패 후 '분노'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203/thm_1733157885119186.jpg)
![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行 억울 "돈 없어서 안 줬겠냐, 청구이의소 제기"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203/thm_1733155674807131.jpg)
!["거짓 기사로 명예훼손" 민희진 VS "뉴진스 탈하이브 계획" 탬퍼링 의혹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202/thm_1733150098285290.jpg)
!["알바 급여만 4500만원"…정준하, 강남 36억 아파트 경매 나왔다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202/thm_1733130266920675.jpg)
![박서진, 가정사→우울증 다 공개했는데…거짓 논란에 '신인상' 날아가나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202/thm_17331192839780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