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명철의 캐치 콜] 복서 이시영이 고백한 감량의 고통
기사입력 2013.07.23 12:02
김덕중 기자

[엑스포츠뉴스=신명철 칼럼니스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손연재가 리듬체조를 관심 종목으로 끌어올렸듯이 여배우 이시영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복싱에 한 가닥 부활의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긴 팔을 이용한 스트레이트 하나로 복싱 여자 48kg급 국가대표가 된 이 젊고 예쁜 여배우는 최근 MBC 인기 토크쇼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감량의 어려움을 고통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얘기했다.
이시영은 경기 전 체중 감량을 위해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물론이고 손톱과 발톱도 깎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무리 해도 몸무게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에는 때를 밀러 목욕탕에 갔다”면서 “그렇게 하니 400g이 빠졌다. 사우나를 했기 때문에 수분이 빠졌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성공했다”고 말해 글쓴이를 웃음 짓게 했다. ‘손톱도 깎고 때까지 밀다니’ 스포츠를 썩 좋아하지 않는 여성 시청자들은 아마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을 터이다.
이시영의 얘기를 들으면서 글쓴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25년여 전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남녀부가 통합돼 처음으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1987년 11월 서독 에센에서 열렸다. 서울 올림픽을 10개월여 앞두고 벌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여서 대회 결과에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컸다. 대회 기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차범근이 아내 오은미 씨와 함께 먼 길을 달려와 대표 선수들을 응원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안병근(71kg급)과 하형주(95kg급)가 금메달, 김재엽(60kg급)과 황정오(65kg급)가 은메달, 조용철(95kg이상급)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던 한국 유도는 대회 3일째까지 하형주와 이쾌화(78kg급)가 동메달을 건졌을 뿐 기대했던 금메달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남은 희망은 김재엽 뿐이었다. 1983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푸에르토리코) 금메달,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김재엽이었지만 그 역시 금메달을 장담할 수 없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김재엽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은 강적 호소가와 신지(일본)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60kg급 경기가 예정된 대회 마지막 날 하루 전 한국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에 갔다. 선수들이 보이지 않아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텔 체육관에 갔더니 사우나가 있었다. 전날 마신 맥주를 뺄 겸 들어간 사우나에서 한국 선수를 우연히 만났다. 김재엽이었다. 경기를 끝낸 선수들은 모두 외출하고 자신만 숙소에 있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호소가와에게 눌렸을 때 심정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글쓴이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김재엽의 몸에서는 땀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왜 그러냐”는 어리석은 질문에 김재엽은 “더 이상 뺄 땀이 없다”고 했다. 김재엽의 대답에는 감량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재엽은 경량급치곤 키가 컸다. 평소 몸무게가 68kg 정도였다. 이튿날 김재엽은 결승에서 벼락 같은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호소가와를 매트에 내리꽂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겪은 패배를 되갚으며 세계선수권자가 됐다.
복싱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1970, 80년대 라이트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 등 프로 복싱 경량급 선수들은 10kg에 가까운 살인적인 감량을 했다. 같은 체격의 외국 선수와 경쟁이 쉽지 않으니 몸무게를 줄여 자기보다 적은 선수와 경기를 해야 했다. 아무리 키가 작아도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성인 남자가 50kg 이하로 체중을 줄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감량은 체급 종목 선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런저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뇨제 등 약물로 몸무게를 빼기도 했다.
여자 선수들은 특히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해선 안 된다. 생리 현상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집이 커지면 그에 맞게 체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체격이 커지는데 따라 체급을 올리면서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한 체급 종목 선수로는 유도의 조민선을 들 수 있다. 에센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한국은 7명의 여자 선수가 출전했지만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도입된 여자 유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였다. 한국 선수 가운데 조민선이 3회전 진출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때 서울체육중학교 3학년인 조민선은 48kg급이었다. 이 꼬마 선수가 이후 52kg급, 56kg급, 61kg급으로 계속 체급을 올리면서 국내 1위를 놓치지 않았고 1993년 해밀턴(캐나다) 대회와 1995년 지바(일본) 대회에서 2연속 세계선수권자가 됐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때 체급은 66kg급이었다.
이시영도 자연스럽게 51kg급으로 체급을 올리게 된다. 자신의 꿈인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감량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할 것이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처음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정식 세부 종목이 된 여자 복싱은 51kg급, 60kg급, 75kg급 등 3개 체급만 열린다.
체급 상향 조정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 사례도 있다. 이시영은 48kg급에서는 긴 팔 길이가 장점이었지만 51kg급으로 올라가면 상대 선수들도 키가 그리 작지 않기 때문에 팔 길이가 큰 무기가 될 수 없다. 펀치의 다양성 등 기술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은 광저우 대회 때 여자 복싱 3개 체급에 모두 출전했지만 75kg급의 성수연만 동메달을 땄다. 경기력이 좋아서 메달을 차지한 게 아니다. 출전 선수가 7명이었는데 운 좋게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고 준결승에서 몽골 선수에게 3-14로 지고도 메달리스트가 됐다. 중국이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고 여자 복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동메달 1개에 그쳤다.
여자 복싱은 지난해 런던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 영국(51kg급)과 아일랜드(60kg급), 미국(75kg급)이 여자 복싱 올림픽 초대 챔피언을 배출한 가운데 중국이 은메달(51kg급)과 동메달(75kg급)을 하나씩 차지했고 인도의 매리 콤이 51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시아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
한국 여자 복싱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다. 그러나 누가 아랴. 1940년대 후반 도입됐으나 “시아버지 밥상을 걷어찰 일이 있냐”는 핀잔만 듣고 사라졌던 여자 축구가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이후 20년 만인 2010년에 20세 이하 월드컵(독일) 3위, 17세 이하 월드컵(트리니다드토바고) 우승에 이어 2013년 7월 현재 중국(17위)과 대만(39위)을 따돌리고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16위에 오를 만큼 성장하게 될지.
여자 축구를 정식 종목으로 만들기 위한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출전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대표팀을 꾸린 한국은 홍콩에만 1-0으로 이겼을 뿐 대만에 0-7, 일본에 1-8, 중국에 0-8, 북한에 0-7로 크게 졌다. 여자 축구 관계자들에게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됐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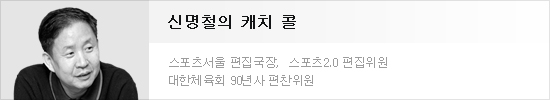
신명철 칼럼니스트 sports@xportsnews.com
[사진=이시영 ⓒ 엑스포츠뉴스DB]
김덕중 기자 djkim@xportsnews.com
- ▶ 조세호, ♥9세 연하 아내 깜짝 공개…모델급 아우라
- ▶ '송종국 아들' 송지욱, 아빠 유전자 물려받았네…축구선수 된 근황
- ▶ '출연료 4만원' 김대호, 죽어라 벌면 뭐하나 "30억 家에서 대형사고"
- ▶ 트와이스 지효, 아이돌 '원톱 글래머'다운 비키니 자태
- ▶ 백지영, 럭셔리한 차량들 자랑…"포르쉐 팔고…아이 때문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사랑과 전쟁' 시어머니 장미자, 지병으로 별세…향년 84세
- 2 "오보 뒤집어씌워"…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MBC에 쏠린 눈 [엑's 이슈]
- 3 "네가 뭔데" 해병대 후배들과 싸우던 김흥국, 무면허 운전에는 '입꾹닫' [종합]
- 4 '4월 결혼' 김종민, 초상권 무단도용 심각…"수익금 빌미로 투자 유도" [공식입장]
- 5 샘 해밍턴 “한국 오고 얼마 안돼 父 돌아가셔…마지막 인사도 못 했다” (총백쇼)
- 6 전현무, 이제 부정도 안 하네…20살 연하♥홍주연에 "'슈돌' 찍자" (사당귀)[종합]
- 7 한유라, 정형돈 ♥짝사랑 지드래곤에 질투 폭발…"쌍둥이들 눈 감아"
- 8 신현준 "셋째 딸 생기고 술 끊어…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려고" (4인용)[종합]
- 9 '아파트 주민' 임영웅X정동원, 실황 영화로 맞붙는다…설연휴 승자는? [엑's 이슈]
- 10 '4남매 엄마' 정미애 "설암 판정 받고 혀 일부 절제…가혹했던 시간" (총백쇼)
- 1 [속보] "양민혁 임대 갈 수도"…"수준 떨어지는 곳" 감독 폭언하더니→토트넘 데뷔 못하고 나가나?
- 2 "최악의 선수, 끔찍하다" 황희찬 방출 외침 커진다…"HWANG도 새 도전 원할 듯" 쐐기→경쟁자 부상 '대반전' 불씨도
- 3 양민혁 임대되나, 잔혹한 현실…"EPL 수준 아냐, 1월 나갈 수도" 英 매체 주장
- 4 충격! 살라 격분 "연봉 깎고 3년 계약? 싫어!"…리버풀 제안 걷어찼다 (이집트 매체)
- 5 '박정태 2군 감독 자진사퇴' SSG, 왜 박정권에게 손 내밀었나…"팀의 육성 상황 잘 이해하고 있어"
- 6 EPL까지 진출한 '변성환의 아이들'…"너무 예쁘게 잘 컸다, A대표팀서 다시 함께 하고파" [방콕 인터뷰]
- 7 '골대 강타+역전패' 손흥민, 아직 안 끝났다!…"괴롭고 실망, 아직 경기 남았고 일어설 것"
- 8 네이마르, 축구 역사상 최악의 먹튀 등극...연봉 '2251억' 홀라당→친정팀 복귀 임박
- 9 김도영도, 나성범도 기대하는 KIA 타선의 힘…"거를 타순이 하나도 없네요"
- 10 SSG, 박정태 자진 사퇴→'박정권' 퓨처스 감독 선임…"대표적 원클럽맨, 유망주 성장 기대" [공식발표]
- 1 T1 김정균 감독-케리아 "스매쉬, 각 봤을 때 주저하지 않아" (LCK 컵) [인터뷰]
- 2 '롤러코스터 상승!'…KT, BRO 2대0 완파하며 장로 그룹 13승 달성 (LCK 컵)
- 3 '나는 이런 게임을 해봤어요!'…KT, 비디디 아지르의 슈퍼플레이에 힘입어 1세트 승리(LCK 컵)
- 4 韓 '발로란트'에 농심도 있다! 붐 e스포츠 꺾고 패자조 2R 진출 [VCT 퍼시픽 킥오프]
- 5 NS 박승진 감독 "밴픽 실수 많아 아쉬워…선수들은 잘해줬다" (LCK 컵) [인터뷰]
- 6 접전 끝에 '승자조 4강' 진출한 젠지... DRX와 '초대형 매치' 성사 [VCT 퍼시픽 킥오프]
- 7 GEN 듀로 "룰러 펜타킬 스틸, 쵸비가 엄청 미안해 하더라" (LCK 컵) [인터뷰]
- 8 DNF 정민성 감독 "풍연 출전, 불독에게 좋은 자극될 것" (LCK컵) [인터뷰]
- 9 '토마토맛 스매시!'…T1, 고난도 조합 소화하며 1세트 NS 제압 (LCK 컵)
- 10 '위풍당당 토마토 군단' T1, 설 명절 전 마지막 경기서 NS 2대0 완파 (LCK 컵)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박주호, '암투병' ♥안나 현재 상태는?…은퇴 후 삼남매 근황 공개
- 2 한혜진, 슬픔 어떡하나…부친상→남편 사별에 "살기 힘들어" 눈물 (아침마당)
- 3 '출연료 4만원' 김대호, 죽어라 벌면 뭐하나 "30억 家에서 대형사고" (홈즈)[종합]
- 4 '이동국 딸' 재아, 부상 어느 정도길래…안타까운 근황
- 5 "친딸 7세 때부터 성폭행" 명문대 출신 父, 충격 실체
- 6 "수치스러운 가정사" 김수찬, 父 폭행·착취 이용설에 분노 (현역가왕2)[엑's 이슈]
- 7 '친형 소송' 박수홍, 딸에 돈 쏟아붓더니…"카드 한도 초과" 당황 (슈돌)[종합]
- 8 '생활고 고백' 성훈, 26억 강남 아파트 매입
- 9 '송종국 아들' 송지욱, 아빠 유전자 물려받았네…축구선수 된 근황
- 10 트와이스 지효, 아이돌 '원톱 글래머'다운 비키니 자태
- 1 '대만 진출' 안지현, 가릴 수 없었던 볼륨감…과감한 행보
- 2 손흥민 이적료 460억 터졌다!…"나폴리 즉각 지불하고 영입하라"→이탈리아 천재 공격수 외쳤다
- 3 김진아 치어리더 '볼수록 빠져들어'[엑's HD포토]
- 4 이금주 치어리더 '경기에 집중'[엑's HD포토]
- 5 김진아 치어리더 '깜찍한 파이팅'[엑's HD포토]
- 6 '레알 출신 라리가 풀백' 마빈 박, 태극마크 선택하나?…"아들의 선택 존중하겠다"
- 7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을 빼돌려? 징역형이다!…'15만 달러' 가로챈 전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8 김민재 미쳤다! 시즌 3호골+결승포 '쾅'…뮌헨, 프라이부르크 원정 2-1 승리→단독 선두 질주 [분데스 리뷰]
- 9 "손흥민 이적 요청" 토트넘 떠나 새로운 도전...'세리에A 1위' 콘테 '러브콜'→'흐비차 대체' 나폴리 입단
- 10 '필드 여신' 유현주 '생애 첫 잡아본 큐대, 연습도 완벽'[엑's 숏폼]
- 1 5민랩, '민간군사기업 매니저' 2차 체험판 오픈…2분기 얼리 액세스 출시
- 2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성장 콘텐츠 업데이트... '로드 아레나' 정규 시즌 돌입
- 3 펄어비스 '검은사막', 개편된 PVP 콘텐츠 '솔라레의 창' 정규 시즌 시작
- 4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카제로스 레이드 3막 '칠흑, 폭풍의 밤' 업데이트
- 5 [부고] 네오위즈홀딩스 나성균 의장 부친상
- 6 부가티 하이퍼 스포츠카,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본격 상륙
- 7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5' 참가
- 8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현대자동차 전기차와 컬래버 선보여
- 9 NHN '2025 한게임포커 챔피언십 시즌1', 온라인 대회 참가자 모집 시작
- 10 그라비티, MMOARPG '라그나로크: 초심'으로 2025년 첫 中 판호 발급
화보







!["오보 뒤집어씌워"…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MBC에 쏠린 눈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5/0127/thm_1737954122262374.jpg)
![블랙핑크=선공개부터 대박?…제니, 로제 신드롬 이어갈까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5/0127/thm_1737956529986011.jpg)
!['아파트 주민' 임영웅X정동원, 실황 영화로 맞붙는다…설연휴 승자는?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5/0127/thm_1737942901444119.jpg)
!["유전자 안 벗어나"→"아기가 잘생겨"…손예진♥현빈 子 실물 '말말말'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5/0127/thm_1737936929685608.jpg)
!['상습 도박' 슈, 바다·유진 사이 모자이크 굴욕…MBC 출연정지 여파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5/0127/thm_1737945809396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