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명철의 캐치 콜] '앙팡테리블' 윔블던의 정현
기사입력 2013.07.09 11:53 / 기사수정 2013.07.09 12:48
김덕중 기자

[엑스포츠뉴스=신명철 칼럼니스트] 스포츠 팬들이 1997년 국립국어원 ‘신어(新語)’ 자료집에 오른 ‘앙팡테리블(Enfant Terrible, 무서운 아이)’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 건 아마도 은퇴한 축구 선수 고종수 덕분일 것이다. 고종수가 약관의 나이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고 왼발 스페셜리스트로 무섭게 성장하던 시기와 이 말이 신어로 수록된 해가 얼추 맞아떨어진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장 콕토의 소설 제목에서 비롯됐다는 이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무서운 잠재력을 지닌 아이나 사물을 일컫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숙한 아이 또는 남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스포츠계에서는 대체로 전자로 쓰이고 있다.
글쓴이가 이 말은 꺼낸 까닭을 눈치 빠른 독자들은 바로 알아챘을 터이다. 테니스의 무서운 신예 정현이 이 기사의 주인공이다. 솔직히 말해 정현의 경기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됐다. 또 다른 ‘앙팡테리블’인 20세 이하 축구 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거듭한 2013년 FIFA(국제축구연맹) U-20 남자 월드컵 경기와 정현이 출전한 2013년 윔블던 테니스대회 주니어부 경기를 같은 채널에서 중계했다. 8일 오전 0시 킥오프한 U-20 남자 월드컵 한국과 이라크의 준준결승에 앞서 정현과 지안루이지 퀸지(이탈리아)의 윔블던대회 주니어부 남자 단식 결승전이 열렸다. 두 경기를 같은 채널에서 연이어 중계했다.
이에 앞서 정현이 보르나 코리치(크로아티아), 막시밀리안 마르테레르(독일)와 치른 8강전과 준결승전도 비슷한 이유로 봤다. 아쉽게도 주니어 세계 랭킹 1위인 닉 키르기오스(호주)와 벌인 16강전은 보지 못했다. 달랑 3경기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아는 척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한때 테니스를 열심히 취재했던 경험을 살려 정현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현은 한마디로 ‘애늙은이’였다. 이 말은 원래 놀림조로 쓰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게 쓴 것이다. 또래 선수들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거의 울듯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심판에게 정현의 스트로크가 아웃인지 아닌지를 놓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쓴이가 본 3경기에서 정현은 시종일관 경기에만 집중했다. 퀸지와 경기에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마음속으로 여러 차례 ‘저 선수가 17살 맞아’라고 했다.
스포츠 팬들은 종목별로 수많은 ‘앙팡테리블’을 보게 된다. 순조롭게 성장해 훌륭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선수 생활을 마치기도 한다. 스스로도 말했거니와 테니스 팬들은 정현이 이형택을 뛰어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형택과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2000년 8월 120회를 맞는 US오픈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었다. 예선을 거쳐 128강이 겨루는 1회전에 나선 이형택은 미국의 제프 타랑고를 세트스코어 3-1로 꺾었다. 복식 전문 선수 타랑고는 복식 세계 랭킹 10위(단식은 42위)에 오른 적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이후의 일이지만 이형택의 가장 높은 세계 랭킹은 95위(2006년 1월)였다.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스포츠 언론은 조용했다. 조용했다기보다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형택은 2회전에서 아르헨티나의 프랑코 스퀴야리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잡았는데 세트별 스코어가 7-6, 7-5, 6-2였으니 접전이었다. 2005년 은퇴한 스퀴야리는 선수 생활 전체를 보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해 6월 프랑스 오픈에서 4강에 올라 자신으로서는 그때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게 웬일이야.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2회전을 통과하다니.” 국내 스포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여자 선수 이덕희가 프로 골프의 박세리처럼 홀로 세계 무대에 도전해 메이저 대회 1, 2라운드를 통과하는 등 선전한 일은 있었지만 남자는 새로운 세기가 다 돼 가도록 아시아 무대에서 맴돌고 있었다.
이때 글쓴이가 일하던 스포츠서울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박찬호 김병현 등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 있는 미국 특파원을 뉴욕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때 스포츠서울 특파원은 미국 남서부 지역인 애리조나주에 있었다. 중대한 결심이라고 한 까닭은 항공 요금 때문이다. 즉석에서 내린 결정이었기에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비행편의 요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국에서 미국 동부 지역으로 가는 요금에 3배 정도였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은 이형택을 믿고 투자했다.
이형택은 스포츠서울의 기대에 부응했다. 32강이 겨루는 3회전에서 독일의 라니어 쉬틀러를 접전 끝에 3-1(6-2 3-6 6-4 6-4)로 꺾었다. 지난해 은퇴한 쉬틀러는 이형택과 맞붙은 이후 성장을 거듭해 2004년 4월 세계 랭킹 5위에 올랐고 2003년 호주 오픈 결승, 2008년 윔블던 준결승 진출 등 수준급 성적을 남겼다. 이형택과 쉬틀러는 1976년 생 동갑이다.
이형택의 16강 진출 소식은 당연히 스포츠서울 1면을 장식했다. 3000천 달러 이상을 들인 결과로서는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16강이 겨루는 4회전 상대가 피트 샘프라스(미국)였다. 이형택이 잘 싸우리라는 예고 기사도 나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고일 뿐이었다. 이 대회 전까지 샘프라스는 US 오픈에서 4차례(1990, 1993, 1995, 1996년), 윔블던에서 7차례(1993,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년), 호주 오픈에서 두 차례(1994, 1997년) 등 메이저 대회 가운데 프랑스 오픈만 빼고 13차례나 우승한 세계 최강이었다. 샘프라스는 이 대회 이후 2002년 US 오픈에서 한번 더 정상에 오른 뒤 코트를 떠났다.
선수 생활의 절정기에서 내려오는 때였지만 샘프라스는 샘프라스였다. 그러나 이형택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맞붙었다. 첫 세트 게임 스코어 6-7이 이를 대변한다. 2-6, 4-6으로 2, 3 세트를 내줬지만 이형택은 이 대회 준우승자인 샘프라스와 후회 없는 한 판 승부를 펼쳤다. 정현은 이런 이형택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스포츠에는 정현에게 힘을 불어넣을 성공한 ‘앙팡테리블’이 많다.
1983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재엽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약관의 나이에 은메달을 차지했고 1987년 서독 에센에서 벌어진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선수권자가 됐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메쳤다. ‘앙팡테리블’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런던 올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김장미다. 잠시 1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자. 글쓴이는 김장미가 19살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평상심을 잃지 않고 80발(본선 60발+결선 20발)의 사격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랐다. 이제 와 보니 정현의 ‘포커페이스’와 무척이나 닮았다.
김장미는 본선에서 2위인 태국의 타냐포른 푸르차콘에게 5점 차 앞서며 여유 있게 결선에 올랐지만 한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천잉에게 0.8점 차로 뒤집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현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된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것과 김장미의 격발 자세가 겹쳐 보인다.
김장미는 2010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하계 유스 올림픽 사격 공기 권총 10m에서 우승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명중한 25m 권총은 화약총 종목이다. 김장미는 2년 사이에 ‘앙팡테리블’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물론 ‘앙팡테리블’의 나쁜 사례도 있다. 스포츠 팬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실례를 들 수 있다. 감히 예견하건데 정현은 그런 사례가 될 재목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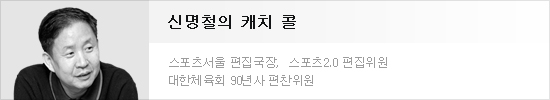
신명철 칼럼니스트 sports@xportsnews.com
[사진=정현 ⓒ 게티이미지 코리아]
김덕중 기자 djkim@xportsnews.com
- ▶ 장재인, 또 노브라 패션…하의 실종까지 파격 행보 계속
- ▶ '이병헌♥' 이민정, 큰아들 공개…기럭지 대박이네
- ▶ 前 프로농구 선수, 처형 살해 후 유기…끔찍한 범죄 전말
- ▶ 오또맘, 누드 착시 영상…"이것 좀 봐주세요 다들"
- ▶ 박규리, 건강 악화 고백 "뇌출혈 투병…母도 못 알아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前 프로농구 선수, 처형 살해 후 유기…끔찍한 범죄 전말
- 2 박규리, 건강 악화 고백 "뇌출혈 투병…母도 못 알아봐"
- 3 "코로나 후유증 심각"…전유성, 야윈 얼굴 근황 '미각 상실' [엑's 이슈]
- 4 '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메이딘 멤버, 과거 발언 재조명 "고백 안 했으면" [엑's 이슈]
- 5 '비밀 결혼' 김범수, '♥전지현 닮은꼴' 아내 공개…'영재' 딸 진로 고민
- 6 "신체부위 핥고 강제 키스"…소속사 대표에 성추행 의혹→메이딘 '불똥' [엑's 이슈]
- 7 "손가락 정성, 그게 관계자"…전소연, '학폭' 수진 이어 하이브 저격했나
- 8 유연석, '협박범' 채수빈 의심 시작…정체 발각되나 (지금 거신 전화는)
- 9 율희, 더 이상 안 참는다…최민환→악플러 연이은 법적 대응 [엑's 이슈]
- 10 "이게 빅뱅이지" 지드래곤·대성·태양 뭉쳤다...'뱅뱅뱅'부터 '판베'까지 [2024 마마 어워즈]
- 1 김민재 또 '충격 폭언' 들었다…"한국대표팀 큰 실수, 오늘도 활약 없었다"→아우크스 3-0 완파, 팔레스타인전 실수 들먹 '억까'
- 2 15-20→22-20 '투혼의 역전승'…여제 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결승행→파리올림픽 이후 첫 금메달 도전
- 3 미국이 이겨 '일본 vs 대만' 결승행 확정…美 '롯데 출신' 프랑코 무너트렸다, 베네수엘라 6-5 제압→아시아 2팀 우승 다툼 [프리미어12]
- 4 손흥민, 토트넘 굿바이! "SON 떠난다" 주장 등장…북런던 굴레 벗어나야 "갈라타사라이 러브콜+아시아 팀도 가능"
- 5 "손흥민 떠나? 다 가짜 뉴스"…1티어 기자는 반박 "토트넘, SON 잔류 100%→2026년까지 동행"
- 6 '충격' 토트넘, 손흥민 결별→산초 영입전 나섰다…맨유 '1300억 먹튀' 획득? "진지한 접근"
- 7 유망주를 향한 '특급 투자' 루키캠프를 해외에서 하다니…키움의 이유 있는 선수단 이원화 [가오슝 현장]
- 8 일본서 귀국→팬미팅 참여 자청…KT 장진혁 "허슬플레이 보여드리겠다" [현장 인터뷰]
- 9 이사 결정 후 SSG→KT 트레이드…오원석 "몸 상태 전혀 문제없습니다" [현장 인터뷰]
- 10 '두산→KT' 허경민, 드디어 털어놓다…"눈물 많이 흘렸다, 두산 팬들께 죄송" [현장 인터뷰]
- 1 T1, 롤드컵 2연패 이끈 '톰' 임재현 코치와 재계약... 2026년까지 [오피셜]
- 2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디렉터스 프리뷰 시즌편 공개
- 3 엠게임 자체 개발 모바일게임 출격... '귀혼M', 정식 출시
- 4 넥슨, 신작 배틀로얄 게임 '슈퍼바이브' 국내 OBT 시작
- 5 엔씨소프트 'TL', 서비스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예고
- 6 'e스포츠도 대박' 10주년 맞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연말까지 축제 이어진다
- 7 '커즈' 문우찬, KT 복귀... '비디디'와 다시 한번 호흡 맞춘다 [오피셜]
- 8 새로워질 핵앤슬래시 명작... '패스 오브 엑자일2', 방대한 콘텐츠+확장된 세계관 '눈길' [엑's 이슈]
- 9 DK, 101점으로 서바이벌 스테이지 2일 차 1위 등극 (2024 PMGC) [종합]
- 10 '지스타 2024'서 韓 유저 눈길 집중됐다... 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성 입증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장재인, 또 노브라 패션 공개…연일 파격 행보
- 2 김종국, ♥빅토리아 여친설 진짜였나? "결혼하면 손잡고 좋을 텐데"
- 3 '김새롬 이혼' 이찬오, 알고 보니 '재혼 6년 차'…아내는 유명 기업 임직원
- 4 '이병헌♥' 이민정, 큰아들 공개…기럭지 대박이네
- 5 이동국 아들 시안, 생일파티서 돈다발 '줄줄'…화려한 현장 공개
- 6 아내·두 아들 살인한 父, 죽는 순간 아들 휴대폰에 담겨 '충격'
- 7 이상민, ♥솔비와 핑크빛 언제부터였나 "호감 이어지면 만남 돼"
- 8 '박수홍♥' 김다예, 출산 회복 중 응급실行…"장기 내려앉는 느낌"
- 9 'IQ 204' 백강현, 과학고 자퇴 후 생일날 전한 뜻밖의 소식
- 10 장재인, 또 노브라 패션…하의 실종까지 파격 행보 계속
- 1 '대만 진출' 이다혜, 격한 춤에 허벅지 초커 훌러덩…화끈하네
- 2 굿바이 토트넘! 손흥민 떠나 맨유 간다...옛 스승과 재회 가능성 급물살
- 3 'E컵 치어리더' 김현영, 유니폼 버거운 볼륨 자태…팬들 난리
- 4 '핵펀치' 대신 '핵따귀'만 남았다…'58세' 타이슨 19년 만의 복귀전, 27세 복서에게 '판정패'
- 5 '이럴수가' 손흥민 1월부터 새 구단 협상…'막아라' 토트넘 발등에 불 떨어졌다
- 6 대한핸드볼협회,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핸드볼대회 성료
- 7 유도훈 전 한국가스공사 감독,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3억 3000만원+지연손해금 배상하라"
- 8 'K-스포츠산업을 세계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도네시아 박람회 참가
- 9 핸드볼 두산 '영원한 GK' 박찬영, 은퇴식서 눈물…"행복하고 즐거웠다"
- 10 대한핸드볼협회,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 개최
- 1 T1 제우스-HLE 도란, 소속팀과 계약 종료 "다음 여정 응원"
- 2 넥슨표 AAA게임, 부산 달궜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 호쾌한 액션 '눈길' [지스타 2024]
- 3 '퍼스트 디센던트', 유저 피드백 반영한 시즌2 업데이트 예고... 반등 신호탄 쏘나 [엑's 이슈]
- 4 '메이플스토리' 유저 관심 집중... 겨울 쇼케이스 'NEXT', 입장권 1분 만에 전석 매진
- 5 라이엇 게임즈 'TFT',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게임' 수상
- 6 '스텔라 블레이드', 글로벌서 재차 눈도장 찍나... 게임업계 오스카상 'TGA' 후보 등극 [엑's 이슈]
- 7 '최선있티' 구마유시, T1과 재계약 발표 "2025년에도 함께한다"
- 8 위메이드커넥트, 방치형 RPG '용녀와 모험 대행단' 출시
- 9 라인게임즈, '창세기전 모바일' 캐릭터 '한조-슈리 스탐가르드' 리워크
- 10 컴투스, 'QA 캠퍼스' 7기 모집 시작... 실무 체험 교육 중심
화보







!["결혼 후 처음"…현빈, 손예진에 子 이름으로 첫 간식차 '사랑꾼 인증'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3/thm_1732368455906375.jpg)
!["군인인데 대상이라니"…방탄소년단 지민, 'MAMA' 수상에 '감격 소감'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3/thm_1732366449138880.jpg)
!["신체부위 핥고 강제 키스"…소속사 대표에 성추행 의혹→메이딘 '불똥'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3/thm_1732358186692626.jpg)
!["코로나 후유증 심각"…전유성, 야윈 얼굴 근황 '미각 상실'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3/thm_1732351440034108.jpg)
!['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메이딘 멤버, 과거 발언 재조명 "고백 안 했으면"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4/1123/thm_1732346540836711.jpg)

